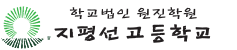페스트(1) - 조동하 |
|||||
|---|---|---|---|---|---|
| 작성자 | 조*하 | 등록일 | 21.02.07 | 조회수 | 140 |
|
'사실 재앙이란 모두가 다 같이 겪는 것이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여간해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전쟁이라는 것은 필경 너무나 어리석은 짓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악착같은 것이다.' -이 책의 시작은 아주 평범하고 한가로운 프랑스의 오랑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했다. 알제리 해안에 면해 있으며 계절의 변화를 하늘이나 어린 장사꾼들이 변두리 지역에서 가지고 온 꽃 광주리를 보고서야 겨우 알 수 있다는 그런 도시인 오랑은 이야기가 진행될 수록 생각보다 우리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다. 책에서 말한 그 '재앙'이 도시에 찾아온 건 책의 거의 처음부터였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책의 1/3을 넘긴 뒤였다. 가장 처음 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땐 대개 이것을 페스트와 연관을 짓지 못했다. 페스트가 퍼진 뒤로도,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악몽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자유를 느끼려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무렵 지금 까지의 사태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을 준 부분이 있다. 바로 '종교'다. 혼란에 빠진 도시 속에서 이 재앙은 신이 내린 형벌이며 우리는 반성하고 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하는 신부 파늘루의 말은 인간에게 종교는 정말 필수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교라는 것은 빠짐 없이 존재하고 어떤 혼란 뒤의 종속적인 무언가인 것 같았다. 이 종교, 즉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진리는 인간에게 희망의 의지를 불어넣어 줌과 동시에 오히려 재앙의 심화만 불러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이전글 | 독서일기3-페스트 (최선) |
|---|---|
| 다음글 | 프랑켄슈타인(9)-곽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