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천사
안녕하세요 한일고 요리천사(안다미로) 동아리 입니다.
안다미로는 음식이 그릇에 넘치게 가득하다는 순 우리말로
우리 동아리는 음식을 나눠 주고 나눠 먹는 즐거움을 아는 동아리 입니다.
요리 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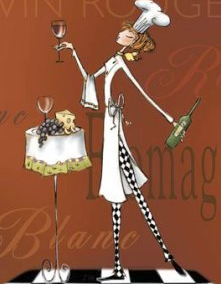
한국의 차 이야기 |
|||||
|---|---|---|---|---|---|
| 이름 | 배길자 | 등록일 | 11.06.14 | 조회수 | 2420 |
|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남 하동군,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고향 전남 보성군은 이맘때면 녹색의 파도로 뒤덮입니다. 유서 깊은 녹차 생산지의 봄은 꽃보다 잎입니다. 남도는 녹차 축제 중입니다. 하동군 화개면과 악양면의 녹차 마을에서 8일까지 '제16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같은 기간 보성 녹차밭에서도 '다향제'가 열립니다. 차향 가득한 시절, 차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봅니다. 이경희 기자 < dunglejoongang.co.kr > 가장 오래된 차나무
하동 화개면 정금리 해발 200m 산중턱의 도심다원에는 높이 4m20㎝, 둘레 57㎝, 지름 18㎝짜리 차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차나무 중에선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이라 경남도기념물 264호로 지정됐다. 차나무는 여느 나무처럼 쉽게 덩치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2008년 한국기록원은 이 나무가 우리나라 녹차나무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나무라는 인증서를 발급했다. 최고차나무는 극소량이지만 지금도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 찻잎으로 만든 '천년차'는 희소성과 상징성 때문에 2006년의 제11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기간 열린 경매에서 100g 13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하동에선 매년 축제 기간에 '최고차나무 헌다례'를 연다. 추정 수령이 1000년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신라 흥덕왕 3년(828년)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차 씨를 가져와 지리산 화개 쌍계사와 구례 화엄사 부근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고,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왕후인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차 씨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차가 외부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그 이전에 가락국의 제례에 차를 올렸으며, 차는 고생대 생물이므로 고생대 토양이 대부분인 한반도에서 고대에 이미 차가 재배되고 있었을 것이라 여기는 자생설도 있다. 통일신라, 고려 시대에 불교가 퍼지면서 음다(飮茶·차 마시기) 풍습이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차만 재배·제조하는 다소(茶所), 차에 관한 일만 전담하는 기관인 다방(茶房)이 있었다. 고려 문인들의 문집에는 수백 수의 차시(茶詩)가 실려 있다. 19세기 후반 고려탑인 가야사 5층 석탑을 무너뜨리자 700년 묵은 송나라 때 용단승설차(龍團勝雪茶) 네 덩이가 나왔다는 내용이 이상적(1804~65)의 '기용단승설(記龍團勝雪)', 황현(1855~1910)의 『매천야록』에 남아 있다. 황제에게 진상되던 귀한 물건이 고려 땅까지 와 탑에 봉인됐던 것이다. 그만큼 고려시대의 차 문화는 융성했고, 일상 다반사(茶飯事)라 할 만했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국호가 바뀌면서 차 문화는 급격히 쇠락한다. 차를 고약처럼 고아 구급약으로 썼을 뿐, 생산량 자체가 워낙 적어 음료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었다. 야생 차밭도 방치됐다. 18세기 차 부흥기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는 최근작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김영사)에서 절멸 위기에 놓였던 차 문화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은 다산이라고 밝혔다. 항간에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초의선사 의순(意恂·1786~1866)에게 차를 배웠다고 적은 글이 많은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다. 다산은 1805년 만덕산 백련사로 놀라갔다가 야생 차가 많이 자라는 걸 보고 승려들에게 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후 다산의 제다법은 보림사와 대둔사의 승려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이규경의 '도차변증설', 이유원의 장시 '죽로차' 등 여러 기록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초의와 다산이 만난 것은 1809년 다산 48세, 초의가 24세 때였다. 초의는 다산에게 학문과 차를 배웠다. 다산이 마시던 떡차 오늘날 우리가 잎차 그대로 마시는 것은 덖음 녹차다. 그러나 지금처럼 진공 포장술도 없고 냉장 보관도 어렵던 과거에 덖음 녹차를 장마철이 지나도록 맛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정민 교수는 여러 문헌을 검토해 다산 선생이 마셨던 주된 차는 '떡차'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산이 69세던 1830년 강진 백운동 이대아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떡차 제조법이 담겨 있다. "모름지기 세 번 찌고 세 번 말려 아주 곱게 빻아야 할걸세. 또 반드시 돌샘물(石泉水)로 고루 반죽해서 진흙처럼 짓이겨 작은 떡으로 만든 뒤라야 찰져 먹을 수 있다네." 이규경(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늘날 차로 이름난 것은 영남의 대밭에서 나는 것을 죽로차(竹露茶)라 하고, 밀양부 관아 뒷산 기슭에서 나는 차를 밀성차(密城茶)라 한다. 교남 강진현에는 만불사(오늘날의 백련사)에서 나는 차가 있다. 다산 정약용이 귀양 가 있을 때 쪄서 불에 말려 덩이를 지어 작은 떡으로 만들게 하고 만불차(萬佛茶)라 이름 지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것은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산이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구증구포(여러 차례 쪄서 말리는 걸 되풀이하는 기법)를 도입한 것은 당시 조선에서 차가 약용으로 사용된 것과 관련이 깊으리라 추정된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조선의 식습관에 비해 녹차는 성질이 너무 강해 위장에 강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차의 차가운 성질을 줄이고 떫은 맛을 부드럽게 하는 데 구증구포 제다법이 효과적이었으리라는 게 정민 교수의 추정이다. 물론 다산이 떡차만 마셨던 건 아니다. 조재삼의 『송남잡지(松南雜識)』의 '황차(黃茶)' 항목에 이런 기사가 있다. "신라 흥덕왕 때 재상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를 얻어 지리산에 심었다. 향과 맛이 당나라보다 낫다고 한다. 또 해남에는 옛날에 황차가 있었는데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정약용이 이를 알았으므로 이름을 정차(丁茶) 또는 남차(南茶)라 한다." 이 해남 황차 역시 '황차'라 불린 것으로 보아 가마솥 덖음차가 아닌 발효차로 보인다. 명선 초의선사 초의는 해남 대둔사에 남아있던 선다(禪茶)를 복원해 '초의차(草衣茶)'를 완성했다. 당시는 서울의 문인들이 청나라 연행(燕行)을 통해 중국의 차문화를 접하면서 차에 대한 애호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초의는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서울의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된다. 명선(茗禪)은 평생 초의의 차를 즐겼던 추사가 지어준 별호다. 특히 정조의 사위인 홍현주(洪顯周)가 차에 대해 질문한 것을 계기로 초의는 『동다송(東茶頌)』을 짓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초의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다성(茶聖)'으로 추앙받기에 이른다. 『동다송』에서 차의 역사, 생산지에 따른 차 이름과 품질, 차 만드는 일, 물에 대한 평, 차 끓이는 법, 차 마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노래하면서 주를 달아 고증학적인 보충 설명을 했다. 그러나 '동쪽의 차를 칭송하다'는 뜻의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막상 우리 차에 대한 언급은 전체 68구 중 4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나는 것도 원래는 서로 같아/빛깔과 향, 기운과 맛, 효과가 한가질세/육안차(陸安茶)의 맛에다 몽산차(蒙山茶)의 약효 지녀/옛사람은 둘을 겸함 아주 높게 평가했지'. 이 땅의 차도 중국의 것에 비해 색과 향기가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초의는 각종 차 이론서를 섭렵하고 다양한 제다법을 시도했다. 찻잎을 머리카락처럼 엇짜인 형태로 뭉쳐 떡차를 만들기도 했고, 덖을 때 댓잎을 섞어 그 향이 스며들게 하는 실험도 했다. 신위(1769~1845)는 초의차를 두고 '자취 숨겨 차를 끓여 박사 이름 얻었다네'라 노래했다. 초의 이전에 대부분의 사대부는 토산차를 맛본 적이 없었고, 연행 길에 비싸게 구해온 중국차를 아껴 마셨다. 그러나 초의차가 알려지고 차문화가 다시 부흥하면서 차 애호가들은 샘물과 우물물, 냇물과 눈 녹인 물의 맛을 비교할 정도로 전문적인 경지에 이르게 된다. 생활다례 행다 순서
손님을 맞으며 간단히 인사한 뒤 차 마시기를 권하며 다례를 시작한다. 2. 예온하기 미리 끓는 물을 보온병에 준비해 두거나 물을 끓여야 한다. 차를 우리기 전에 뜨거운 물로 다구를 데운다. 찻잔이나 다관(차주전자)을 미리 예열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숙우(큰 대접)가 준비돼 있다면 끓인 물을 숙우에 붓는다. 잠시 후 이 물을 다관에 붓고, 조금 있다가 다관의 물을 찻잔에 붓는다. 이렇게 하면 그릇이 데워져 따듯하게 된다. 찻잔에 담긴 물은 차를 우리는 동안 퇴수기에 버린다. 3. 차 우리기 차를 다관에 넣는다. 끓는 물을 숙우에 붓고, 물의 온도가 60~80도 정도로 내리기를 기다린다. 이 온도는 차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 나는데, 고급 차는 60도 내외, 중급은 80도, 하품은 90도 내외이며 발효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 난다. 4. 차 내기 우러난 차를 찻잔에 따른다. 이때 찻잔을 한번에 채우지 말고 3분의 1씩 따라야 한다. 그래야 여러 잔의 차 농도도 맞추고, 함께 마신다는 의미도 되새길 수 있다. 5. 차 마시기 찻잔을 들고 차의 색을 보고 향을 맡는다. 천천히 조금씩 마시며 입안에 찻물을 굴리면서 맛과 향을 느낀다. 다과가 있을 경우 첫잔의 차를 음미한 뒤 다과를 먹는다. 다과를 먼저 먹게 되면 깊은 차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차를 마시다가 조금 더 차를 우려야 되겠다 싶을 때 재탕을 시작한다. 6. 정리하기 담소를 나누고 차 마시기도 끝나면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 다구를 씻어 제자리에 정돈한다. 자료:명원문화재단 |
|||||
| 이전글 | 치즈의 세계 |
|---|---|
| 다음글 | 양주의 모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