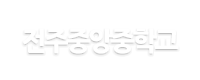『맹자(孟子)』 7편 목록양혜왕(梁惠王) 상(上), 하(下) 공손추(公孫丑) 상(上), 하(下) 등문공(?文公) 상(上), 하(下) 이루(離婁) 상(上), 하(下) 만장(萬章) 상(上), 하(下) 고자(告子) 상(上), 하(下) 진심(盡心) 상(上), 하(下)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1장盡心知性則知天。存其心,養其性,所以事天也。
?壽不貳,修身以俟之,所以立命也。
해석마음을 다하여 본성을 알면, 곧 하늘(天)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요절(夭折)이든 장수(長壽)든 마음에 두지 않고,
몸을 닦으며(수양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운명을 세우는 것이다.
핵심 요약“진심지성즉지천(盡心知性則知天)”: 마음을 다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 유가 철학의 궁극 목표인 ‘하늘과 하나 되기(天人合一)’를 말함. “존기심, 양기성”: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 → 수양의 길 “수신이사지”: 죽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수양하면서 담담히 기다리는 것 → 유가식 운명관(命)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2장원문孟子曰:
「天下之生物,盡皆備於我矣。
反身而誠,樂莫大焉。
?恕而行,求仁莫近焉。」
해석맹자가 말하였다: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만물의 이치)은 모두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실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용서하며 행동한다면, 인(仁)을 구하는 데 이보다 가까운 길은 없다.”
해설 및 핵심 사상“天下之生物,盡皆備於我矣” 인간은 만물의 이치를 내면에 지니고 있으며, 우주의 이치가 인간 안에 완비되어 있다는 유가의 인본주의적 사고. 인간은 단순한 자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도덕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
“反身而誠,樂莫大焉” “?恕而行,求仁莫近焉” ‘자신에게는 엄격하게(强), 남에게는 너그럽게(恕)’ 행동한다면, 인(仁)을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이 구절은 공자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의 연장선에 있으며, 유가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 짧은 장에는 맹자의 인간관, 도덕관, 그리고 행복관이 응축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평가받습니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3장원문孟子曰: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해석맹자가 말하였다:
“부귀로는 그를 음란하게 만들 수 없고,
빈천으로는 그 뜻을 바꿀 수 없으며,
위협이나 무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 **‘대장부(大丈夫)’**라 한다.”
해설 및 핵심 사상이 장은 맹자의 대표적 **대장부론(大丈夫論)**으로, 도덕적 이상 인간상을 제시하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富貴不能淫":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貧賤不能移": 가난하거나 천한 처지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威武不能屈": 강압이나 위협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유가의 의지적·도덕적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4장원문孟子曰:
「居天下之廣居,立天下之正位,行天下之大道,
得志,與民由之;不得志,獨行其道。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해석맹자가 말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도리)에 거하고,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
세상에서 가장 큰 길(진리의 길)을 행한다.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따르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도를 행한다. 부귀로는 그를 유혹할 수 없고,
빈천으로는 그 뜻을 바꿀 수 없으며,
위협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을 일러 **대장부(大丈夫)**라 한다.”
해설 및 핵심 사상이 장은 사실상 제3장의 확장 버전으로, 대장부의 도덕적 삶의 자세를 더 넓은 시야에서 설명합니다. 주요 개념“居天下之廣居” 도(道)라는 가장 넓은 곳에 거한다. “立天下之正位” 정의롭고 바른 자리에 선다. “行天下之大道” 진리를 실천하며 산다.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는: **세속의 성공 여부(得志 / 不得志)**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해도 혼자라도 도(道)를 따른다는 강한 도덕적 독립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앞 장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장부 정의로 마무리됩니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5장원문孟子曰:
「仁者如射,射者正己而後發。
發而不中,則不怨勝己者,反求諸己而已矣。」
해석맹자가 말하였다: “어진 사람(仁者)은 활쏘기와 같다.
활쏘는 자는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 화살을 쏜다.
쏘아서 맞지 않으면,
자신보다 잘 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뿐이다.”
해설 및 핵심 사상이 짧은 장은 맹자가 자의적 반성과 수양의 자세를 활쏘기에 비유한 명문입니다. 핵심 포인트:"正己而後發": 자신을 바르게 한 후 행동한다 → 자기 수양의 중요성. "不中不怨勝己者": 실패하더라도 남 탓하지 않는다. "反求諸己而已矣": 오직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
**어진 사람(仁者)**란, 외부 탓을 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수양을 통해 도달하려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활쏘기(射)는 유가에서 수양의 상징적인 예로 자주 쓰이며, 공자도 『논어』에서 비슷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君子無所爭,必也射乎。”
(군자는 다투지 않되, 다투더라도 활쏘기에서처럼 예(禮)를 지킨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6장원문孟子曰:
「求則得之,舍則失之,是求有益於得也。
爲其有求於己也,求則得之,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해석맹자가 말하였다: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이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 것,
이것이 곧 ‘구하는 것이 얻음에 유익함이 있다’는 뜻이다.”
해설 및 핵심 사상이 장에서는 **도(道)나 덕(德), 인(仁)**과 같은 도덕적 가치는 자기 안에서 구할 때에만 의미 있게 얻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개념 해설:“求則得之,舍則失之”:
→ 구하려 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즉, 도덕적 실천도 끊임없는 자기 노력(구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 “有求於己”:
→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유가적 수양 정신.
이는 공자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도 통하는 맥락입니다. 반복을 통해 진리를 강조하는 문체는, 고대 유가 경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사법입니다.
이 장은 도덕적 자각과 실천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맹자의 핵심 사상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7장원문孟子曰:
「天下之本在國,國之本在家,家之本在身。」
해석맹자가 말하였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국가)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가족)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개인(몸, 자신)에 있다.”
해설 및 핵심 사상이 짧은 구절은 유가 사상의 핵심적인 질서 구조를 아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맹자는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순차적 기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해석:天下之本在國
→ 천하(사회 전체)의 질서는 국가가 잘 다스려져야 가능하다. 國之本在家
→ 국가는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가 바로 서야 안정된다. 家之本在身
→ 가정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 자신’이 바르게 수양되어야 유지된다.
이 구조는 훗날 『대학(大學)』에 나오는 유명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도 직결되는 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요약하면:나 → 가족 → 국가 → 천하
모든 도덕과 정치의 출발점은 자기 수양(修身)이라는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8장
원문
孟子曰:
「所不足者,雖有天下,無所加也;
所太過者,雖無一土,無所損也。
書曰:『抑損之,又損之,至於無有,
無有,故可以?天下王。』」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비록 천하를 더한다 하여도 더할 것이 없고,
지나침이 있는 사람은,
비록 한 뼘의 땅도 가지지 않더라도 덜어지는 것이 없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억제하고 또 억제하며,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이르면,
그 ‘없음’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였다.”
해설 및 핵심 사상
이 장은 내면의 수양과 절제, 그리고 겸허함의 가치를 말합니다.
주요 포인트:
-
“所不足者,雖有天下,無所加也”
→ 이미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천하를 준다 해도 더해질 것이 없다.
→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에 있다는 말.
-
“所太過者,雖無一土,無所損也”
→ 지나침이 있는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본래 손해 볼 것이 없다.
→ 즉, 내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잃을 게 없다는 아이러니.
-
『書』의 인용 ? 『서경』
→ “억제하고 또 억제하며, 마침내 무(無)에 이른다.
그 무(無)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 절제와 겸허의 미덕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가능하다는 뜻.
핵심 요약
-
진정한 리더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면의 수양 상태로 판단된다.
-
**절제(損之)**를 통해 비움에 도달하고, 그 ‘비움’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된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9장
원문
孟子曰:
「愛人不親,反其仁;治人不治,反其智;
禮多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을 사랑했는데 친해지지 못했다면,
그 **인(仁)**이 부족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람을 다스렸는데 잘 다스려지지 않았다면,
그 **지혜(智)**가 부족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예를 갖췄는데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공경(敬)**이 부족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행동함에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몸(마음과 행동)이 바르면,
천하가 자연히 그에게로 귀의할 것이다.”
해설 및 핵심 사상
이 장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성찰의 태도를 강조하며,
맹자의 수신(修身) 철학과 유가의 내면 윤리관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주요 해석 포인트
-
“反求諸己(반구저기)”
→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유가 핵심 교훈.
-
사랑(仁), 다스림(智), 예(敬)
→ 인간관계와 정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감정·지혜·예의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
-
“其身正而天下歸之”
→ 자기 자신이 바르면 세상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은 공자의 "군자정이(君子正而民從之)"와도 연결됩니다.
핵심 요약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10장
원문
孟子曰:
「人有?言:『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國之本在家,家之本在身。」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천하, 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개인(몸, 자신)에게 있다.”
해설 및 핵심 사상
이 장은 앞서 제7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형식입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자주 “천하와 국가”를 말하지만, 그 근본적 순서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요점 정리:
-
“人有?言:天下國家”
→ 사람들은 ‘천하’와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입에 자주 올리지만,
-
“天下之本在國…”
→ 그런 큰 질서도 결국은 가정과 개인의 수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
즉, **정치와 사회의 근본은 결국 개인의 도덕적 수양(修身)**에 있다는 유교의 핵심 원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핵심 요약
-
천하(天下) → 나라(國) → 가정(家) → 개인(身)
-
큰 것을 바로잡으려면,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
이는 『대학(大學)』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사상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11장
원문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以其存心也。
君子所性,仁義禮智根於心,其生色也,
?然見於面,?於背,施於四體,
四體不言而?。」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마음을 지니는 데에 있다.
군자의 본성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인데,
이것들이 마음에 뿌리박혀 있다.
그 마음이 생기면,
맑고 밝은 기운이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도 넘쳐 흐르며,
사지(四肢)에까지 퍼지니,
아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절로 알아보게 된다.”
해설 및 핵심 사상
이 장에서는 군자(君子)의 도덕적 품성과 내면 수양이 몸 전체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핵심 포인트
-
“所以異於人者,以其存心也”
→ 군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지위나 외모가 아닌,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기르는가에 달려 있다.
-
“仁義禮智根於心”
→ 군자의 도덕적 본성은 인·의·예·지, 즉 유교의 4덕이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
-
“?然見於面…”
→ 그런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난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빛과 몸짓,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의미.
진심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숨길 수 없고,
그 덕은 자연히 남에게 전달된다는 유교의 ‘덕의 감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요약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12장
원문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庶民去之,君子存之。
舜明於庶物,察於人倫,由仁義行,非行仁義也。」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거의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지닌다.
순임금은 만물에 밝았고,
인륜(人倫)에 밝았으며,
인(仁)과 의(義)에 따라 행하였다.
그것은 단지 인과 의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인과 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였다.”
해설 및 핵심 사상
이 장에서는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하며,
그 차이를 지키는 자가 군자임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풀이
-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지만,
그것은 도덕성과 인륜을 지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庶民去之,君子存之”
→ 보통 사람들은 그 차이를 쉽게 버리지만,
군자는 도덕의 불씨를 간직하고 지킨다.
-
“舜明於庶物,察於人倫”
→ 순임금은 사물에 대한 이해도 뛰어났고,
**사람과의 관계(인륜)**도 잘 살폈다.
-
“由仁義行,非行仁義也”
→ 순은 인과 의에 ‘따라서’ 행했지,
인과 의를 억지로 실천한 것이 아니다.
즉, 도덕적 행위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는 뜻.
핵심 요약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13장
원문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反身而誠,樂莫大焉。
?恕而行,求仁莫近焉。」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자기를 미루어 남을 이해하고 힘써 행한다면,
인(仁)을 구하는 데 이보다 가까운 길은 없다.”
해설 및 핵심 사상
이 장은 맹자의 대표적인 인성론 사상을 담고 있으며,
내면의 수양과 실천, 그리고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요 구절 풀이
-
“萬物皆備於我矣”
→ 천하의 모든 도리(道理)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는 인간은 도덕적 본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맹자의 ‘성선설’ 근거입니다.
-
“反身而誠,樂莫大焉”
→ 자신을 반성하고 진실하게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
(외부의 성공보다 내면의 성찰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뜻)
-
“?恕而行,求仁莫近焉”
→ 자기를 미루어 남을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실천한다면,
인(仁)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뜻.
“恕(서)”는 공자가 말한 황금률, 즉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과도 통합니다.
핵심 요약
-
인간은 본래 도덕적 가능성을 내면에 모두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성실히 돌이켜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실천(恕)**은 **인(仁)**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 제14장
원문
孟子曰:
「天下之言性也,故故曰性也,故者以利?本。
所惡於智者?其鑿也。若槁木死灰,則不可與有言矣。」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천하 사람들이 ‘성(性, 본성)’을 말할 때,
대개 일부러 만든 성품, 곧 인위적인 것을 말한다.
이런 인위적인 성품은 이익을 근본으로 삼는다.
내가 지혜(智)를 싫어하는 것은,
그 인위적인 계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마른 나무나 죽은 재와 같다면,
그와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
해설 및 핵심 사상
이 장에서는 맹자가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인의(仁義)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자연적 본성임을 밝힙니다.
주요 구절 풀이
-
“天下之言性也,故故曰性也”
→ 세상의 사람들이 성(性)을 말할 때,
억지로 만든 성질(인위적 성)을 마치 본성인 것처럼 여긴다.
-
“故者以利?本”
→ 그 인위적 성품은 이익을 중심으로 삼는다.
즉, 사람들은 본성을 이기적 욕망으로 착각한다는 것.
-
“所惡於智者?其鑿也”
→ 맹자가 ‘지혜(智)’를 싫어한다는 건,
계산적이고 억지로 꾸민 꾀를 뜻함.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비판함.
-
“槁木死灰”
→ “마른 나무”나 “죽은 재”는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의 비유.
이런 사람은 도덕적 가능성조차 잃었기에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는 말.
핵심 요약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인위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함.
-
참된 본성은 자연스럽고 순수하며 인의(仁義)의 씨앗을 지님.
-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가르침과 교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
|